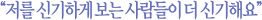2011아시아문화포럼 자원봉사자 장수인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 외국인 있었어?” “이상하다~ 외국인 이름은 없었는데, 누구지?”
2011아시아문화포럼 자원봉사자 첫모임부터 눈길을 끈 그녀. 흰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분명히 외국인인 것만 같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능숙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장수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한 일주일
포럼 기간 내내 화제였다. 영 아시안 세션 특별강연자로 초청된 광주 출신 망명 작곡가 정 추 선생(86세)을 부축하고 다니는 예쁜 외국인 학생이 누굴까? 모두를 궁금하게 한 그녀는 13살 때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입양온 장수인 양(조선대 러시아어과 3).
“대한민국 역사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정 추 선생의 통역 자원봉사자로 함께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1923년 광주 출생, 월북해 평양음대 교수를 지내다 차이코프스키음대 유학중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 러시아로 망명했지만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당했던 인생은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 평생 조국과 고향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을 음악으로 쏟아낸 그 분의 삶이 안타깝고 감명 깊어 선생의 특별강연 땐 눈물을 쏟았다. 아흔을 바라보는 정 추 선생의 고향 방문 안내자가 되어 담양 선산도 함께 가고, 다음날 입을 옷을 다려 드리면서 옆에 꼭 붙어 다녔다.
러시아 카프카스에서 한국으로 온 그녀
‘나스자 바스카에바’. 러시아 카프카스의 작은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늘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딸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면 막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 2001년, 아들의 유학을 위해 러시아에 머물던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 가족의 인연을 맺었고 멀고 먼 한국길을 따라 나섰다.
“그때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새로운 환경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얼굴 생김도, 문화도 다른 한국. 그것도 외국인이 많지 많은 광주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을 법도 한데 그녀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한국인 친구들에 둘러싸여 즐겁게 다녔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학교 다니는 게 당연하죠. 물론 초등학생 땐 나를 구경하러 오는 친구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경계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세계 무대로 뛰는 동시통역사 꿈꾼다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신기했다”는 그녀에겐 이미 ‘세계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걸까. 러시아의 가족들과도 메일과 영상통화로 연락을 이어왔고, 고등학교 때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회관 건축현장으로 해외봉사를 떠나 러시아의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조선대 러시아어과에 입학한 뒤에도 박람회 통역봉사 등에 참여하다 영어스터디 모임 선배의 권유로 이번 아시아문화포럼 자원봉사에 참가하게 됐다.
“제가 러시아어를 한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정 추 선생님이 한국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어는 거의 쓸 일이 없었지만, 그 끈이 아니었다면 역사의 산 증인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행운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전부터 꿈꾸던 동시통역사라는 목표가 더 단단해졌다. 통역사로 활동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는 큰 사람, 물론 그녀의 활동무대는 세계다.